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벤처 투자 공식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시리즈 A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B와 C에서 스케일업(Scale-up)을 한 뒤, D나 E 단계에서는 IPO(기업공개)나 M&A로 엑시트(Exit)하는 것이다. 투자의 라운드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F'를 넘어가는 순간,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회사는 왜 아직도 상장을 못 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이 오래된 불문율이 산산조각 났다. 주인공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업 '데이터브릭스(Databricks)'다. 그들은 무려 '시리즈 L(Series L)'이라는, 벤처 캐피털 역사상 보기 드문 알파벳을 달고 펀딩 시장에 나타났다. 기업가치는 무려 1340억달러(약 180조원).
이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시리즈 L까지 간다는 것은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며 ‘연명 치료’를 받는 다운라운드(Down-round)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는 정반대다. 그들은 넘치는 현금과 압도적인 성장세를 무기로, 상장이라는 제도권 진입을 거부하고 스스로 '비상장 제국'을 건설하기로 택했다.
물론 이러한 '네버엔딩 펀딩'의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대표적이다. 스페이스X는 정기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수혈하며, 상장 없이도 기업가치를 수백조원대로 키웠다. 핀테크 공룡 '스트라이프(Stripe)'와 상장 전 '팔란티어(Palantir)' 역시 알파벳 시리즈의 한계를 시험하며 비상장 시장에 오래 머물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프라이빗 IPO(Private IP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형식적으로는 사모 투자 유치지만, 규모와 성격 면에서는 사실상 IPO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의 까다로운 상장 심사와 로드쇼 없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주식을 세일즈하는 새로운 모델이 정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 기업들은 왜 굳이 '상장'이라는 왕관을 거부할까? 가장 큰 이유는 '분기 실적의 러닝머신(Quarterly Earnings Treadmill)'에서 내려오기 위함이다. 상장사가 되는 순간, 경영진은 매 분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수익성 검증을 견뎌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AI 군비 경쟁' 시대에 당장의 수익성은 독이 될 수 있다.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의 전쟁,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수천억원 규모의 GPU 확보는 당장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용(CapEx)을 요구한다. 상장 시장은 이러한 적자를 용납하지 않지만, 사모 시장은 '미래의 독점'을 위해 기꺼이 인내한다.
이러한 프라이빗 IPO 전략은 기업에게 '밸류에이션 방어막'을 제공한다. 공개 시장(Public Market)은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주가가 매일 요동친다. 하지만 사모 시장의 기업가치는 투자자와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즉, 시장의 광기나 공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상장 후 겪을 수 있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나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 창업자가 강력한 그립을 쥐고 장기 비전(Long-termism)을 밀어붙일 수 있다. 데이터브릭스가 시리즈 L까지 오면서도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는 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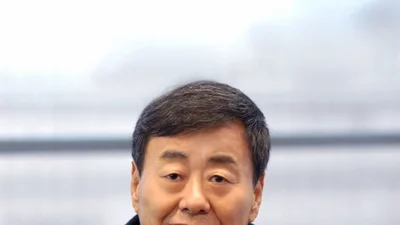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