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뉴욕 맨해튼 5번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이클 B. 김 & 경아 박 로비(The Michael B. Kim and Kyung Ah Park Lobby)'를 마주하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이 거대한 문화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사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다. 뉴욕의 하이 소사이어티와 월스트리트에서 그는 아시아 금융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린 선구자이자, 부의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통한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진화된 형태로 소비된다.
그러나 시선을 서울로 돌리면 풍경은 뒤틀린다. 같은 인물이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입길에 오를 때면 그는 '약탈 자본의 우두머리'나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격하된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M&A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은 '국가 기간산업을 위협하는 투기 세력'이다. 뉴욕에서는 문화 예술의 후원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서울에서는 기업의 고혈을 빠는 포식자로 매도되는 이 극단적인 간극은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한국 사회가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중적임을 방증한다. 한국의 재계와 여론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습 경영에는 관대하면서도, 시장 논리에 따라 경영 효율을 따지는 사모펀드(PEF)의 개입에는 반사적인 거부감을 드러낸다.
김병주 회장을 '약탈자'로 규정하는 논리의 기저에는 기업을 주주의 것이 아닌 '오너 일가의 소유물'로 보는 봉건적 사고가 깔려 있다. MBK파트너스가 개입한 많은 기업은 비효율적인 경영이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던 곳들이었다. 자본은 감정이 없다. 오직 수익을 좇아 비효율을 제거하고 가치를 높이는 곳으로 흐를 뿐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약탈'이라 부른다면, 병든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의 칼날조차 폭력이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시장에서 김병주 회장의 성공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아시아 시장에 '주주 자본주의'의 원칙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줄과 혈연이 지배하던 아시아의 기업 풍토에 숫자와 계약에 기반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했다. 그의 펀드가 굴리는 자금의 상당수가 미국과 캐나다의 연기금이라는 사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의 운용 능력과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물론 사모펀드의 단기 차익 추구 성향에 대한 감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맹목적인 '투기 자본'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을 가로막는 자해 행위다. 외국계 자본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배타성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경영권 방어가 절실한 경영진들이 애국심에 호소하며 주주의 이익을 해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설적으로 MBK파트너스와 같은 거대 자본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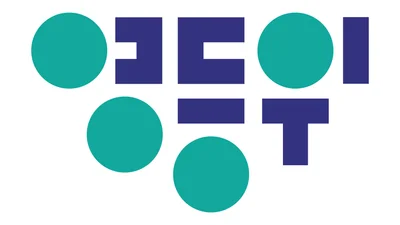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