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The MIT Press, 2020)에서 저자인 헤일구아(Germaine Halegoua) 캔자스 대학 교수는 대학 홈페이지에 실린 소식을 통해 책의 출판 사실을 알리면서 "현재의 스마트시티를 돌아보고, 일반 시민들이 더 진보된 도구로 민과 관의 거대한 개발인 스마트시티가 주는 ‘약속’과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구아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주는 많은 약속과 정당성에 이중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스마트시티가 흥미로우면서도 골치 아픈 이유다. 모든 것이 양면적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혁신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구축에 일률적인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고 강조한다. 도시는 복잡하며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경험하는 다양한 인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변수도 많다는 것이다.
헤일구아 교수의 저서는 '디지털 도시: 미디어와 사회적 생산'(New York University Press, 2020)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 ‘스마트시티’는 MIT 출판사의 지식을 위한 필독(에센셜 날리지) 시리즈의 일부로서, 시사 문제에 관한 포켓북으로 구성돼 있다.
헤일구아는 스마트시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 그녀는 스마트시티가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이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와 스마트시티로 개조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사람들과 스마트시티 기획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려한다. 헤일구아는 모든 도시 현상을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하는 '솔루션주의'를 비판한다.
헤일구아는 올해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봉기나 홍콩에서의 보안법 시행 이전에 이 책을 썼다. 그런데 그녀의 책에서는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시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이 깔려 있다.
헤일구아는 그러나 "스마트시티는 항상 감시 도시라고 100% 말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스마트시티를 데이터 수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도시로 생각하고, 공무원이나 자치단체가 수집된 데이터를 변경하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면 스마트시티는 항상 감시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측정해야 하고, 분석해야 하며,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의 행방이나 쇼핑이나 대화 상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감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푸른 들판에 처음부터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하거나 재개발하는 도시와는 달리 헤일구아는 스마트시티의 대안으로 ‘소셜시티’를 제안하고 있다.
그녀는 "소셜도시 모델은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것 이상을 희망하는 다른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즉 "도시의 기획자들과 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구현할 때 그들이 창조하는 장소의 유형과 도시와 기술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는 누구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헤일구아는 독자들에게 “개조된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불평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헤일구아는 "선천적으로 나쁜 기술은 없다"고 말했다. "카메라, 데이터 분석, IoT와 같은 기술은 문화가 내재된 도구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안에서 설계한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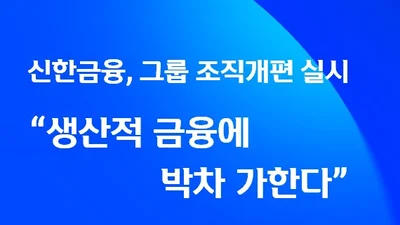

![비상장 주식의 NYSE ‘포지 글로벌’…스페이스X도 살 수 있어요 [마켓 디코드]](https://cdn.www.smarttoday.co.kr/w400/q85/article-images/2025-12-25/b2fc43b5-9753-4cb1-a823-5f1903192039.png)
![[인사] KB국민카드](/image-placholder.png)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