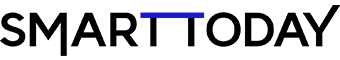적금 탄 고객들 VIP로 대접해 ELS 가입 유도

금융가에는 5년 괴담이 있다. 2007년 키코(Knock-In, Knock-Out)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태, 2018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그리고 2023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까지. 왜 4~5년 주기로 은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될까.
지난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 악습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감언이설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며 은행들이 소비자를 낚는 사이 감독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금융상품을 직접 사고 판 은행과 소비자 탓만 하는 모양새다.
◇속으론 '호갱님' 적금 낚았다 vs.겉으론 VIP 대접
그렇게 위험한 상품에 왜 가입했냐 비판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카페에서 공통된 피해 경험담을 들여다보면 은행의 영업 전략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심리를 능수능란하게 파고들었다.
우선 예·적금 만기 고객을 VIP실로 모시고 가서 환심을 산다. 그간 경험하지 못한 친절에 기분 좋아진 고객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상품이라 미끼를 투척한다.
그 다음은 호감형으로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은행 직원이 나설 차례. 이렇게 말문을 연다. “나도 가입했다. 한 번도 손실 난 적 없다. 중국이 망할 리 있겠냐? (이 상품은) 우량주만 묶었다. (고객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좋은 상품이라 조만간 매진된다.”
소비심리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자문해준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안전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여긴다. 매년 수천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집행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든 영향이다.
지난해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광고선전비로 집행한 예산은 총 6300여억원. 신한은행이 1540억원을, 국민은행은 1500억원씩을 사용했다.
위험한 상품을 은행이 중간에서 판매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소수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금융에 무관심한 MZ 세대조차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312/39167_33024_167.jpg)
◇안다고 착각하게 만든 '설명의무'
물론 소비자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설명의무,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고령 투자자 숙려제도 등 많은 규제가 은행을 제약한다. 특히 설명의무는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시키도록 강제한다. 소비자가 잘 들었다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녹음까지 남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다 잘 몰랐다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 거짓말이나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서 은행 직원의 설명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실상 기만에 가깝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설명서를 끝까지 다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감독 당국도 자필 서명을 받고, 녹음하는 게 소비자 보호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금융에 프로라고 하는 은행원이나 금융감독원장도 (듣고도) 어렵다 토로할 정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파는 사람조차도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솔직히 저도 수십 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 답변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은행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시인했다.
◇'원금보장' vs.,'원금보존'..뭔 차이?
어려운 데다 교묘하기까지 한 금융 화법도 덫과 같다. 투자상품 설명서에서 원금 보장과 원금 보존이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원금 보장은 원금을 100% 돌려주는 상품이란 뜻이다. 반면에 원금 보존은 원금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지만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란 말이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고위험을 고난도라고 포장하는 것도 같은 식이다. ELS(주가연계증권), ELT(주가연계신탁)처럼 외계어 같은 줄임말도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L’ 들어가는 상품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ELS 2번 가입한 나 어느새 '전문투자자'..은행의 호객 길들이기 백태
적정성과 적합성의 원칙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둘 다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먼저 권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일반 소비자와 전문 소비자로 구분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월 말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며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ELS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젊은 재투자자야말로 피해자라고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은 말한다. 환매가 잘되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부터 추천한 후 서서히 공격적인 상품으로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고객을 길들였다는 호소다.
실제로 판매된 ELS 19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KB국민은행 한 곳이 팔았는데, KB국민은행 고객만 유독 전문소비자가 많았을까? 아니면 자신에게 적정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상품을 스스로 사고 싶다고 말한 일반소비자가 몰린 걸까?
◇날려도 되는 돈은 없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달리 개인투자자 손실을 대할 때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로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이 4~5년을 주기로 한탕 크게 벌일 때마다 당국은 은행 내부에서 통제하라고 꾸짖기만 한다. 무겁게 처벌했다면, 5년마다 반복되긴 어렵다. 도둑을 키운 게 누군지 생각해볼 일이다.
당국은 은행에 이자 장사 비중을 줄이고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하라고 주문한다.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나 신탁의 가죽을 쓴 파생상품을 팔아서 은행이 수수료를 버는 게 이자 장사보다 나은지 의문이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연계 ELF·ELT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지난 17일 기준 약 8조 4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4조 77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은행(1조 4833억 원), 신한은행(1조 3766억 원), 하나은행(7526억 원), 우리은행(249억 원) 순이다.
- '주가 반토막' 케어젠, 오너가 21살 장남에 100억원 주식 증여
- [COP28] 도시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맞서는 방법
- 라스베이거스 “광케이블·5G통합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완성”
- '무인도의디바' 제작사 임원 '배임' 수사..파장 어디까지?
- 'K방산' 한화 vs.현대 운명 가른 '키 포인트' 뭐길래
- 홍콩 ELS 짝 날라..시중은행, 닛케이 ELT 판매 중단
- "홍콩ELS 판매중단, 은행·증권·캐피탈 수익성에 '영향'"
- H지수 ELS 판매 고심한 금융당국..은행 창구 분리? 전면 금지?
- 9월부터 은행서 ELS 판매한다..‘거점점포 전용 창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