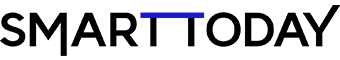빅테크 Google 상흔, 책자 발간으로 다시 부각
"계획에만 치우쳐 단계별 접근 소홀" 지적

캐나다 토론토에서 구글이 스마트시티를 건립하려다 실패한 사례에 대해 분석한 책이 나왔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매체인 이머징테크브루는 저자와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를 최근 게재했다.
구글의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는 지난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13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주민들의 반대,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난 2020년 프로젝트 해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빅테크로써의 구글의 명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자율주행차부터 하수도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론토 근교의 저개발지역인 워터프론트의 4만 8,500 제곱미터(약 1만4,690평)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역사가 길지 않은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중 가장 두드러진 실패 사례로 거론되면서 토론토를 넘어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건립 노력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언론인 조시 오캐인이 <Sideways: The City Google Couldn’t Buy>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구글의 실패 사례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이머징테크브루가 저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내용이다.
- 당신은 책 전체에서 사이드워크랩스와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이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썼다. 왜 두 파트너 사이에 그처럼 많은 소통 잘못과 장애가 발생했고, 그 것은 이 프로젝트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 사이드워크랩스는 워터프론트 토론토가 근본적으로 작동되기 힘든 기관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사이드워크랩스는 시, 주, 연방정부에 동일한 정도로 보고했는데, 그것은 최대 주주가 없다는 뜻이다. 감시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워터프론트 토론토가 정책을 만들지 않았던 터라, 연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했어야 했다. 또 구역법이나 조례 변경을 원했다면 시 정부와 이야기했어야 했다. 건물코드의 경우는 주정부의 입법권한인 동시에 시 정부 이슈이기도 했다. 사이드워크랩스는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워트프론트 토론토가 원스톱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원스톱 기구로 보이게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다른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구였다.
-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실패한 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이드워크인가, 정부인가?
△ 연방정부, 주, 시는 워터프론트 토론토가 프로젝트 계약을 제안했다는 사실 뒤에 숨었는데 이 기구는 사이드워크랩스의 요청과 요구에 실제로 관여할 힘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세력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좌절하게 됐다. 이 책의 근본적인 교훈은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것이다. 사이드워크랩스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그 또한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 알파벳은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조직이 되게끔 계속 압력을 더 크게 가했다.
- 이 실패 사례에서 다른 스마트시티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나?
△ 나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상당히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용하려는 기술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그 센서에서 수집, 사용, 배포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만약 공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세상과 경쟁해서 마련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예일 분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이드워크랩스가 실패한 이유가 너무 큰 꿈을 꾸었기 때문인가? 만일 사이드워크가 쓰레기 처리 같은 일에 먼저 집중했다면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 그렇다. 나는 사이드워크랩스가 워터프론트가 요청했던 과제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집중하거나 개별 기술로 범위를 좁혀 집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터이다. 그들이 또 토론토에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어떤 도시에 땅을 샀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들이 뭔가를 짓고 싶다고 말한 다음 정부에 로비를 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 규정개정을 고려하겠는가?”라고 말했다면 그런 개정이 확실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드워크는 토론토를 너무 믿은 나머지, 토론토시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어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시를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런 접근으로 인해 그들은 관료주의와 수 많은 장애를 만났다. 결국 사이드워크가 계약을 맺은 그 기관, 즉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이슈] 개인정보보호 이슈 토론토, 극단 행보…“스마트시티 건설 중단”
- [초점] 구글 스마트시티 솔루션 자회사 사이드워크랩, 회사 접나
- [초점]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전통기업에 도전하는 빅테크
- [초점] 사이드워크 랩, 토론토 퀘이사이드 이어 포틀랜드 스마트시티 포기…반복되는 실패의 이유
- 토론토 사이드워크랩, 스마트시티 포기 후 빌딩 임대...철수 수순?
- 토론토 스마트시티 무산 후폭풍...사이드워크 랩 직원 20명 해고
- 구글의 퀘이사이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철수로 잃어버린 9가지
- [초점] 구글의 토론토 퀘이사이드 프로젝트 포기, 근본 원인은 ‘프라이버시’ 문제다
- [칼럼] 구글의 포기 결정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 2020년에 지켜볼 미래의 스마트시티 5 곳은?
- 애틀랜타市, 스마트시티 모범 사례로 꼽혀
-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 IPO..국내 관련주 '훈풍'
- 현대차 합작회사 모셔널, 우버와 제휴 통해 완전자율주행 택시 10년간 보급
- 신촌 연세로에서 '마지막 문화 행사'
- [스투/리포트] UN이 바라보는 스마트시티…‘인간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혁신’이 핵심
- 자율주행차 관심 높지만 신뢰못해..구매 "아직"
- 세계 최대 네옴시티도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