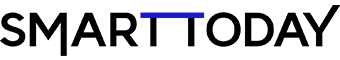인수 후 매출 줄던 G마켓…JV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여
중국 현지 매체,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으로 해석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G마켓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돌입했다. 중국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Grand Opus Holding Limited)이 그 핵심이다. 정용진 회장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랜드오푸스홀딩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 5, 즉 50%씩 동일한 지분율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신세계는 이마트 자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하던 G마켓 지분 100%를 그랜드오푸스홀딩에 현물출자하면서 지분 50%를 확보했다. 알리바바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과 현금을 출자해 나머지 50%를 보유했다.
2024년 12월 27일 설립된 그랜드오푸스홀딩은 초기에는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사무소가 있던 스테이트타워 남산에 본점을 뒀다. 이후 이 합작법인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입주한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했다가, 최근에는 G마켓과 같은 건물인 강남파이낸스센터로 본점 주소지를 옮겼다. 신세계그룹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추락하는 G마켓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신세계그룹은 2021년 약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G마켓(당시 이베이코리아)을 인수했다. 당시 신세계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사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과감한 베팅이었다.
그러나 인수 직후부터 경고음이 울렸다. 2022년 1조3636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조1966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다시 9612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G마켓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연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1649억 원에 달한다.
실적 부진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점유율의 하락이다. 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20%에 달했던 G마켓의 점유율은 2020년 15%대로 떨어졌고, 신세계 인수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기준 온라인 쇼핑시장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G마켓·옥션·SSG닷컴을 합산한 신세계그룹의 점유율은 10.1%에 그쳤다. 같은 시기 쿠팡은 24.5%, 네이버는 23.3%였다.
◆ 상호 보완적 전략 동맹…”反쿠팡 동맹”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간 협업은 상호 보완적 ‘전략 동맹’으로 평가된다. G마켓은 국내 유통 전문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갖췄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자본력과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 60만여 판매자가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계열사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알리바바 입장에선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판매자와 소비자를 자사 글로벌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며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 G마켓이 결국 알리바바 손에?…우려도 있어
일각에서는 G마켓이 중국 거대 리테일 기업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합작법인의 두 당사자는 미래의 이별 가능성에 대비해 조건을 주주 간 계약으로 정해둔다. 따라서 알리바바가 궁극적으로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지배주주로 올라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는 이번 합작을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출해사소룡(出海四小龙)’으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틱톡샵의 한국 공략을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전략으로 분석한다. 이들 플랫폼은 상품 판매를 넘어 결제·물류·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풀 서빙(Full Serving)’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반 크로스보더 물류·포워딩 플랫폼 바이56(BY56)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한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산 직구 상품은 7083만 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바이56은 “이는 2021년 대비 약 3배 성장한 수치로, 한국의 높은 온라인 소비 성향을 토대로 중국 판매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