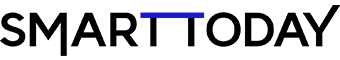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외국인관광객 성지로 부상중인 올리브영(이하 '올영')의 올해 점포당 최대매출이 7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올영'의 가파른 성장세와 달리 GS25, CU 등 기존 편의점과 파리바게뜨 등 여타 가맹사업자들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불과 2∼3여년전까지만 해도 이들 프랜차이즈업체의 점포당 연간최대매출액은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영으로의 최근 매출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여타 프랜차이즈 점포주들이 울상이다.
26일 올리브영 등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올리브영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404만명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매출이 전년비 189% 성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 지역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 매출의 90%이상을 외국인들이 소화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23일 옛 명동밀리오레 건물에 올리브영 명동역점을 오픈했다. 개장 첫날 매출이 1억5천만여원을 찍었을 정도로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이어진 주말 매출 역시 엇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연결된 올리브영 명동역점의 매장 규모는 약 570㎡ 규모이다. 명동역 5·6번 출구와 메인 거리를 잇는 허브 매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곳 올리브영 명동역점에는 사후 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라운지가 운영되고, 주력 품목인 뷰티·헬스 상품뿐 아니라 K팝과 K푸드를 판매하는 특화 공간이 마련됐다.
올영은 지하철 명동역을 기점으로 을지로입구역까지 이어지는 명동 메인도로상에 현재 총 7개 매장을 두고 있다.
이중 명동중앙로점의 최근 월매출이 70억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광 비성수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연간 매출이 700억원 이상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리브영은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하루 3번 편도로 운행하는 버스 '올영 익스프레스'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성수동에도 '팩토리얼 서울' 건물 1~5층에 대형매장을 연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억원을 들여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을 사들이기도 했다. 앞으로 3년간 성수역은 '성수(올리브영)역'으로 표기된다.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2년도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2022년말 총 매장수는 1298개로 이중 직영점이 1066곳, 가맹점은 232곳으로 구성됐다. 직영점 비율이 82% 이상이다.
당시 232개 가맹점당 매출액 평균치는 17억4660만원 수준이었다. 최대매출점포매출액이 53억8685만원, 가장 부진한 매출을 올린 점포가 2억777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최대매출을 올린 가맹점은 울산지역에 소재했다. 매출이 높은 곳일수록 본사 직영점포로 운영중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파리바게뜨의 2022년도 가맹점비율은 99%로 상반된다. 2022년말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 3446개중 3419개소(99.2%)가 가맹점이다. 직영점은 27개소에 그쳤다. SPC삼립그룹 계열은 파리바게뜨 외에 파스쿠찌(커피전문점), 잠바주스(스무디/음료), 배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 던킨도너츠(제과제빵),빚은(떡) 잇투고(패스트푸드), 라그릴리아(이탈리안레스토랑) 리나스(샌드위치) 등 10여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2년도 전국 파리바게뜨 3419개 점포당 평균매출액은 7억5474만원. 연간 최대와 최저점포당매출은 22억5400만원과 599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점포당 매출 1등과 꼴찌가 모두 서울지역에 위치했다.

편의점 대장격인 GS25와 CU의 2022년말 점포수는 각각 1만6448개와 1만6787개소. 이들의 가맹점포비중 역시 각각 99.3%와 98.9%로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GS25의 점포당 평균매출액은 6억3972만원으로 CU의 점포당 매출평균치 6억2179만원으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반면 최고매출점포 순위에서는 CU가 GS25를 거꾸로 앞질렀다. CU의 최고매출점포가 50억1079만원을 기록해 GS25의 43억1000만원을 앞질러 순위가 뒤바뀐 것.
2022년 당시만해도 올리브영, CU, GS25의 가맹점포당 최고액은 서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이들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