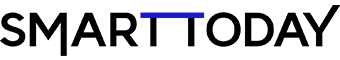미국에서 사업 도전하려면 경제자유도 따져야…“뉴욕·캘리포니아는 피해라”

경제적 자유는 경제 성장에 관한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정부가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의 창업이나 일하는 방식 선택, 기업 투자 등을 어렵게 하면 경제 성장은 정체된다.
한국은 이해집단의 ‘밥그릇 싸움’에 2000년대 초반 왕성했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운이 꺾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종종 관련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막히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반발에 의해 좌절된다. 오죽하면 창업을 해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해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까지 들린다.
동남아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트는 기업가가 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불안해졌다. 대기업과 유망 중기 벤처는 미국을 노크한다. 가능성만 있다면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어느 곳으로 가야할까.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기술과 사업의 메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적당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약 20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을 포괄하는 북미 각 주의 정책을 평가해 왔다. 경제적 자유, 즉 개인이 불필요한 제약이나 규제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분석 결과는 북미경제자유도(EFNA)라는 이름의 보고서로 매년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11월에 보고서가 발표됐다. 조만간 2023년판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흘러 나오는 이야기로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022년판은 어땠을까.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는 플로리다가 1위였다. 그 뒤를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테네시 주들이 이었다. 그런데 하위권이 재미있다. 하위 5개 주는 꼴찌로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하와이, 버몬트, 오리건 주 순이었다. 준 주를 포함할 경우 푸에르토리코가 최하위로 처졌다.
이 순서가 올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의 좁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리 권장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물론 성과를 내는 그룹도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랜 기간 벤처 인큐베이터로 활동해 온 김종갑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본투글로벌(Born to Global)' 소속의 일부 기업들이다. 이는 거의 김 센터장의 개인 역량으로 일군 결과다. 그런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곳에 진출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많은 연구에서 경제자유도가 높은 주일수록 경제 성장은 빠르고 실업률은 낮으며, 1인당 소득은 높다. 창업활동은 활발하며 인구증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실리콘밸리의 거점 도시 새너제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사례에서 보듯, 캘리포니아의 사업 환경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제 성장의 붐을 타고 물가가 고공행진한 탓에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더디고, 시를 떠난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여전히 30%를 넘는다. 요즘 생성 AI 플랫폼을 비롯한 AI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여럿 진출해 희망을 주고 있다지만, 아직 갈 길은 요원하다.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있다. 세제 개혁은 그 중 하나다.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법인세 등 세 부담을 덜어주면 큰 유인책이 된다. 랭킹 2위권인 뉴햄프셔는 소득세가 없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세도 최근 인하했다.
과도한 규제도 경제적 자유를 떨어뜨린다. 조지메이슨대 싱크탱크인 마카타스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두 주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와 뉴햄프셔, 테네시, 플로리다 주는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추진력 중 하나다. 미국의 경제적 성공은 노동자, 투자자, 기업가가 누리는 고도의 자유에 기인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