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50년까지 20억 명이 추가로 도시에 이주할 것으로 유엔은 추정한다. 도시는 경제 건설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까지 인류 발전의 연결 고리에 놓여 있다. 스마트시티를 주창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도시의 모습을 볼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네이처지가 온라인판을 통해 이를 진단했다.
제11차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 정착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처가 탐구해 온 많은 다른 SDGs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를 향한 진전은 미흡하다.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 건설을 담당하는 유엔 기구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2023년 보고서는 세계가 SDG의 11개 목표 중 대부분 또는 전부를 놓칠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시는 수많은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장소다. 주요 주제는 주택, 폐기물 관리 및 운송이다. 연구자들은 복잡성 연구, 시스템적 사고 및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 모든 측면을 연결함으로써 나쁜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
세계의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들은 지속적인 불평등으로 가속화된다. 10억 명 이상이 수도, 위생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은 집이 전혀 없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장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이는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2021년 보고서에서 SDG 목표를 채택한 국가 중 도시에 대한 명시적 전략을 세운 나라는 4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려는 시도도 자원의 제한, 개인정보보호 우려 및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방콕은 지역 협동조합과 공조함으로써 비공식 주택과 홍수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우간다 캄팔라는 도시와 주민의 관계를 재작업해 저소득 지역사회를 우선시하고 도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늘리는 폐기물 관리 관행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병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폐플라스틱을 수집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버스 운영에 자금을 투입해 대중교통을 강화한 것이다.
도시 연구를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 및 영국의 연구원들을 연결하는 피크어반(Peak Urban)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모색한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연구소의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범죄율, 평균 보행 속도, 도시 생활 등을 관리하는 간단한 수학 법칙을 내놓았다. 런던 대학의 마이클 배티와 폴 롱리는 도시 성장의 본질에 대해 고찰했다.
연구는 불평등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통합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개별 도시의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예컨대 자카르타의 어떤 지역이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더울지를 알아내기 위해 기후 모델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온이 버스 운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같이 알아낸다. 버스 운전자들의 손실은 일시적으로 도시 전역의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 피크어반과 연결된 연구원들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도시의 상하수도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 그리고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특정 도시의 경험과 성공 사례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사례별 모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도시는 국제 및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시성이 부족하다. 전문 지식을 갖춘 정책 전문가 및 사회과학자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수잔 파넬은 "도시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 달성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장소”라고 단언했다. 스마트시티로의 진행이 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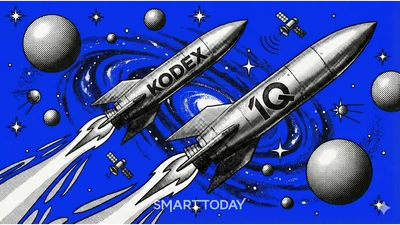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