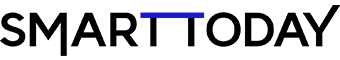현존하는 팽귄 중 몸집이 가장 큰 황제팽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매년 5~6월에 남극 해빙에서 번식한다. 그런 황제펭귄이 지난해에는 거의 번식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충격을 안긴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기관 ICN(인사이드클라이미트뉴스)이 전했다.
황제팽귄은 지난해 5월과 6월, 남극 해안가 해빙 위 번식지에 도착했고, 펭귄들은 7월 말과 8월에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주변 해안의 해빙이 11월에 예기치 않게 부서져 육지에서 떨어져나갔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 황제펭귄 서식지에 재앙을 가져왔다. 이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영 국립 남극연구기구(BAS) 조사팀의 현장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이 지역의 번식지 5곳 중 4곳에서 수천 마리의 펭귄 새끼가 얼음이 분해되면서 익사하거나 얼어붙어 번식에 100% 실패했다. 조사팀원인 BAS의 생물학자 놈 랫클리프는 "5개 중 4개가 실패한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1월이 되면 팽귄 새끼들의 깃털이 방수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그 전에 해빙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벨링스하우젠 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식지를 확인한 BAS의 펭귄 연구자이자 연구팀원 피터 프렛웰은 ”오랜 기간 팽귄을 연구해 왔지만 한 계절에 이 정도 규모의 황제펭귄 번식 실패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빙이 무너지면 새끼가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면서 “현재의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극심한 해빙 손실이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며 황제팽귄 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남극 대륙 전역에 걸쳐 약 60개 군집에 약 60만 마리의 황제펭귄이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벨링스하우젠 해 지역의 서식지는 전체의 약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집이었던 웨델해의 핼리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치명적인 번식 실패가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1만 4000~2만 5000쌍이 번식을 위해 모였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핼리만 주변의 해빙이 평소보다 일찍 깨져 거의 모든 새끼 황제팽귄이 죽었다. 얼음이 더 안정적인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BAS 조사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에 남극 대륙에 있는 황제펭귄 서식지 62개 중 30%가 부분 또는 전체가 파괴됐다.
BAS의 해빙 물리학자인 제레미 윌킨슨은 위기는 펭귄뿐만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북극에서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극 해빙은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을 비롯한 다른 남극 생태계 및 생명체와도 관계가 깊다. 얼음이 녹으면 바다에 영양분이 추가돼 플랑크톤 성장을 촉진한다. 작은 크릴새우부터 거대 흰긴수염고래까지 해양 동물의 먹이사슬은 플랑크톤의 번성과 일치하도록 맞춰져 있다. 해빙의 범위에 변화가 생기고 시기가 바뀌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후 변화는 해빙이 녹는 것뿐 아니라 간헐적인 폭풍도 일으켰다. 지난 3월 커런트바이올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비정상적으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남극 갈매기 둥지가 완전히 무너졌다. 남극 제비의 수도 급감했다. 극지방의 모든 생명체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TV에서 수시로 보는 ‘북극곰의 위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기후 모델은 지구 가열화가 남극 주변의 바다와 대기를 덥힘에 따라 더 강한 눈과 폭풍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극의 따뜻해진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폭풍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빙산이 녹아내리는 동시에 눈폭풍도 갈수록 거세지는 것이다.
지난 몇 년은 남극 대륙의 기후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상 이변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은 황제팽귄을 비롯해 극지방 조류의 개체수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모델은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