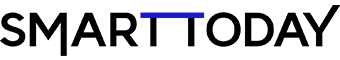역사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바다에 접한 해안가에 도시를 만들었다. 알려진 많은 도시들이 바다와 멀지 않다. 해상 운송과 물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내륙에 대도시가 형성된 것은 항공 이동이 시작된 이후 본격화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홍수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보다 범람원에 마을, 도시를 더 많이 건설해 왔다는 뜻이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최근 논문은 이를 추적해 분석한 결과다.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서도 범람 우려 지역에의 거주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네이처 온라인판은 발표된 논문을 요약해 게재했다. 논문은 특히 이런 추세가 기후 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인적,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워싱턴 D.C.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준 렌트쉴러는 “밀집 거주지인 많은 국가의 대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현 시대에 실제로는 홍수에 대한 노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 재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렌트쉴러 분석팀은 마을에서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인간 거주지의 범위가 198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85.4%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강 수면 상승과 폭우로 인한 홍수, 폭풍 해일과 해수면 변화로 인한 해안 홍수를 모두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해수면이 150cm이상 높아져 홍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 즉 최악의 홍수로 땅이 잠길 수 있는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된 것이다. 홍수 안전 지역에서의 성장을 크게 앞서고 있다.
전체 개발 토지의 약 6%에 해당하는 약 3만 6500평방km가 홍수 위험이 '매우 높음' 범주에 속했다. 또 7만 6400평방km가 '높은' 홍수 위험 범위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이 지역 전체 정착지 중 약 18.4%가 홍수에 취약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북미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각각 정착지의 4.5%와 4.6%로 노출이 가장 낮았다.
중국이 홍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중국의 경우, 1985년부터 30년 동안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범주에 속하는 정착지의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썼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조경 건축 회사 투렌스케이프(Turenscape)는 도시 홍수 관리를 위해 중국에 '스펀지 도시'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콘크리트 표면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녹색의 투과성 자재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투렌스케이프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전 30년 동안 중국 신규 개발의 70%가 범람원이나 고위험 범람 지역에서 벌어졌다.
범람원에서의 개발은 주로 토지 부족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적합한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과거 홍수 위험 때문에 회피했던 지역에서의 신개발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요 항구 도시, 해변 커뮤니티 및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해안 지역의 관광 허브가 확장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세계가 기후 변화 대응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닐라 소재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인을 위한 기후 솔루션’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주민들의 정착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기상재해 노출 및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자체 및 국가의 도시 정책의 핵심이 기후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향후 전 세계의 기후 위험과 도시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