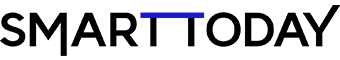농업에서의 기술 활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는 도구와 방법을 개발해 땅을 갈고 동물을 길들여 왔다. 기계로 상징되는 산업에서 이제는 디지털과 정보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시대를 맞아, 현재의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은 지구를 위협하고 미래에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많은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해결책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농업과 식량 안보의 미래를 진단하는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요약글로 게시했다.
게시된 어젠다에 따르면 농업은 에너지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야다. 또한 세계 전체 담수 취수량의 70%를 차지하는 것도 농업이다. 게다가 과잉 생산과 지속 불가능한 농법이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돼 토양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농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4000억 달러의 생산성이 손실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은 세계 농작물의 29%를 생산하는 영세 농가라는 지적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8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세계 농업 식량 시스템이 식량 생산, 유통, 소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어젠다는 강조한다. 동시에 자연과 물에 친화적인 긍정적인 농산물 생산의 길을 개척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무려 14.5%가 축산업에 의한 것이고, 그 65%가 육우와 젖소에서 배출된다. 투자자들은 이를 단백질 혁신의 호기로 파악하고 있다. 2022년 유럽에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24% 증가했고 기업은 5억 7900만 유로를 조달했다. 그러나 생활, 영양,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단백질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집약화 지원, 목적에 맞는 다양화 추진, 소비자의 요구를 지원하는 혁신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밀 발효는 기존 낙농 생산 방법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단백질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기여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유제품을 제조하는 리밀크사는 이스라엘 보건부와 싱가포르 식품청으로부터 제품 인가를 받았다. 회사는 1억 20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소젖을 사용하지 않는 우유 생산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건설에 착수했다.
이 분야의 변혁은 복잡하고, 기술 혁신에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력과 정책지원,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담수의 이용
가뭄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담수 사용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필요한 관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농업부터 가뭄에 강한 작물을 만드는 생명공학의 진보까지 농업 관행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르헨티나 키리모사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해 농업에서의 물이용 검증,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농가가 ‘물중립(취수·배수에 의한 수자원 영향을 제로로 하는 것)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37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모니터링해 지금까지 720억 리터 이상의 물이 절약됐다.
◆ 토양 품질 악화
기술은 토양 건전성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기후와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 열쇠는 토양 건전성에 대한 지식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이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인도 부미트라사와 같은 최첨단 기업은 전 세계 탄소 제거 크레딧의 모니터링, 보고, 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성과 AI 기술을 도입했다. 회사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500만 에이커의 토지를 관리하는 15만 명 이상의 농가 및 목장주와 협력하고 있다. 회사의 플랫폼은 토양 개량과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 측정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해 검증된 탄소 크레딧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 혁신적인 모델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부미트라는 2023년 어스샷상 최종 후보로도 올랐다.
◆ 파트너십의 힘
기계 학습, AI, 정밀 발효는 농업·식료 시스템의 장기 과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공하는 수많은 기술 솔루션의 일부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수반하지 않는 단독 솔루션으로는 기술이 확대되지 않는다. 기술을 의미 있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협동 즉 파트너십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WEF는 공공,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 관계자와 함께, 식량혁신허브(Food Innovation Hubs)를 시작했다. 상향식이면서 지역에 맞는 접근법을 취하는 이 허브는 인도, 콜롬비아, 베트남, 유럽, 아랍에미리트, 케냐, 르완다 등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부미트라사를 민관 파트너십으로 선정. 건강한 토양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건조 기후 생태계에서 생산을 촉진하는 기술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환경 재생 농업을 대규모로 전개하기 위한 서비스와 농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식량혁신가 네트워크로 묶어 지식교환을 촉진하고, 기술을 소개하며 혁신을 촉진한다. 네트워크는 200개가 넘는 회원과 함께 글로벌 식량 안보에 대처하고 있다.